이민정
reminiscence Ⅱ
Apr 19 - May 2, 2013
opening reception 6pm Apr 19

이민정_무제_합판에 유채_82×61cm_2013
몇 년 전, 한 평야를 지나다가 드문드문 세워진 거대한 원통형의 벽돌 건물을 봤다. 농사지을 때 이용한다는 그 건물은 마치 곡물 창고처럼 보였다. 그것이 실제 창고였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곡식이 들어차 있었는지는 논외로 하자. 탁 트인 지평선, 맑은 하늘, 넓은 들판. 그 가운데 우뚝 서 있는 건물을 보며, 나는 찰진 밥 한 수저가 입안에 가득 찬 느낌을 받았다. 침이 고여서 입맛을 다셨다.
이민정 작가의 작업실을 두 번째로 찾았을 때, 작업 중이던 작품 하나가 꼭 그랬다. 위 아래로 길쭉한 화폭은 반으로 나뉘어 깊은 청색과 붉은 갈색이 칠해져 있었다. 청색과 갈색의 경계 위에는 두 개의 기다란 ‘8’자 모양이 나란히 서있었다. 순간, 평야 위의 장면이 떠올랐고, 다시 입맛을 다셨다. 그 그림이 좋아졌다.
대화 중 작품에 대한 호감을 표하자 잠시 후, 뭘 그린 것 같으냐고 작가가 물었다. 조금 망설였다. 곡물 창고 같아서 배가 부르고 입에 침이 고여요. 그래서 좋아요. 아무래도 ‘미학적’인 대답과 거리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침이 고인다는 말은 빼고 적당히 에둘러 답을 했다. 작가가 말했다. 뼈를 그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은 저렇게 걸려 있지만 원래는 가로로 길게 걸어 놔요. 그날 대화는 추상화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말하며 시작됐다. 추상화 역시 엄연히 상하좌우가 있기에 방향을 바꿔 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터였다. 입이 바싹 말라서, 입맛을 또 다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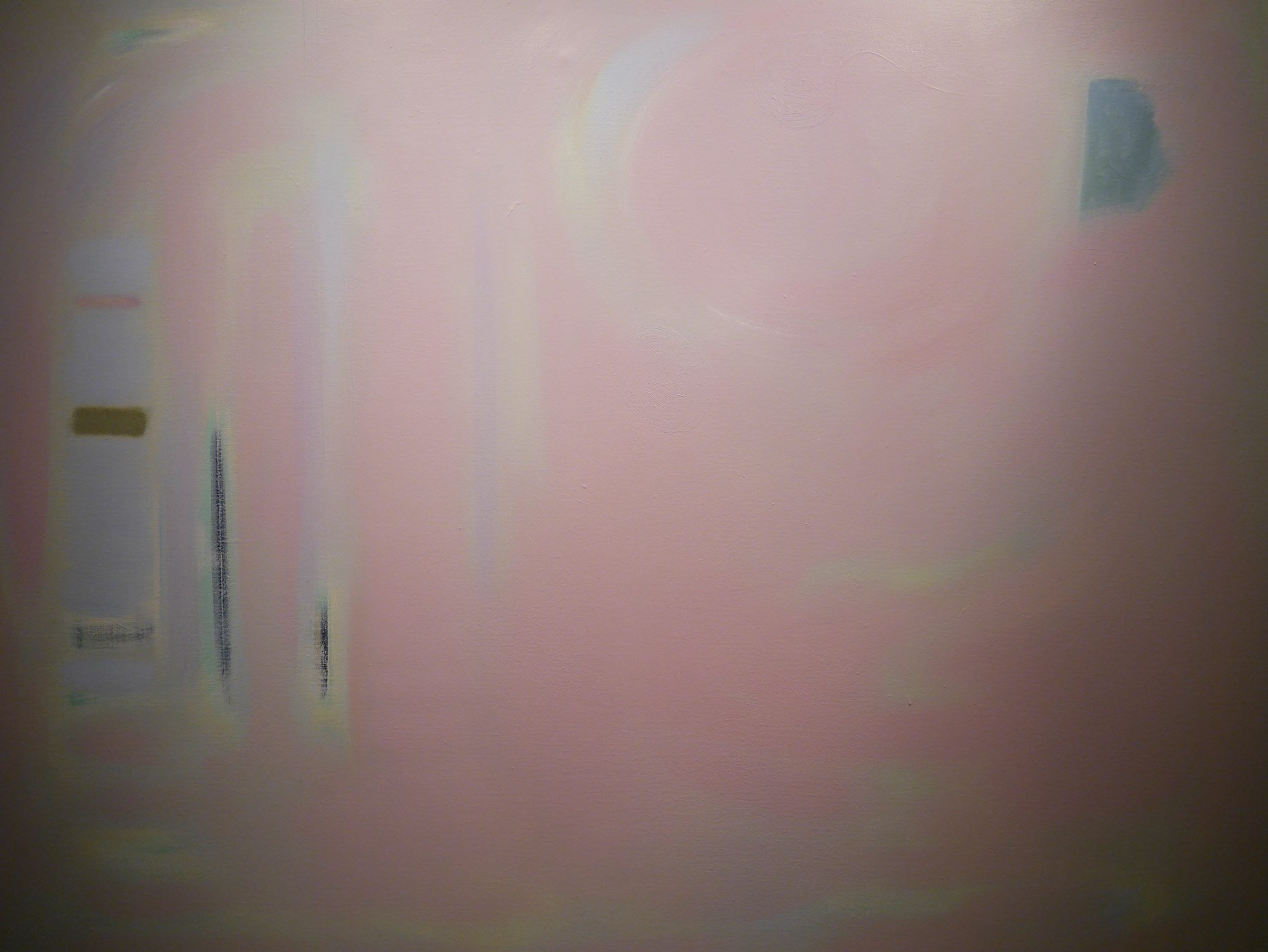
이민정_무제_합판에 유채_50×50cm_2013

이민정_무제_캔버스에 유채_100×100cm_2012

이민정_무제_캔버스에 유채_162×130cm_2011
지난 1월 말부터 여러 차례 이민정 작가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매번 작가와 작품을 오해했던 것 같다. 나의 무지 탓이 컸다. 이런 식이었다. 이야기를 쓸 때 작위적인 요소가 과해지면 어느 순간 자괴감이 들던데, 그림을 그릴 땐 어떤가요. 혹은 작가님 그림을 보고 ‘무엇을 그린 거죠?’ 라고 묻는 것은 결국 ‘잘못된’ 건가요? 앞의 질문이 글과 그림(그중에서도 추상화)의 차이를 무시한 무지에서 비롯됐다면, 뒤의 질문은 화폭 속의 형태에 어떤 사물이 반드시 일대일로 대응된다고 생각했던 내 강박에 대한 강박에서 비롯됐다.
아마 모든 답은 이번 전시의 제목 ‘상기하다(reminiscence)’에 들어있는 듯하다. 작가는 그리는 행위가 기억이나 추억 등과 같은 듯 다른, ‘상기(想起)’하는 작업이라 말한다. 그것은 (나는 이렇게 글로 쓰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언어화할 수 없는 무엇이다. 조금 비약하자면 ‘마음의 자화상’ 쯤이 되는 것도 같다. 화폭 위에는 선과 색채의 연속이지만, 전시장 안의 공기 속에는, 작가가 상기해낸 마음과 정서의 켜가 가득하다.
운동선수들은 결정적인 순간, 몸에서 힘을 뺀다. 이번 전시의 관객에게도 필요한 미덕인 듯싶다. 뇌에 힘을 빼고, 심호흡을 하자. 그리고 그림을 본다. 긴장을 풀고, 느끼면 된다. 어떤 그림엔 아련한 봄날이 있고, 다른 그림은 무릎이 시리다. 그림과 그림 사이에서 미소가 번질지도 모르고, 전시장 공기에서 밥 냄새를 맡을지도 모른다. 입맛을 다셔도 된다. (서두에 언급한 그림은 전시 목록에서 빠졌다. 내가 오해한 탓은 아니라고 작가에게 확답을 들었다.)

이민정_무제_캔버스에 유채_194×131cm_2013

이민정_무제_합판에 유채,혼합재료_45×65cm_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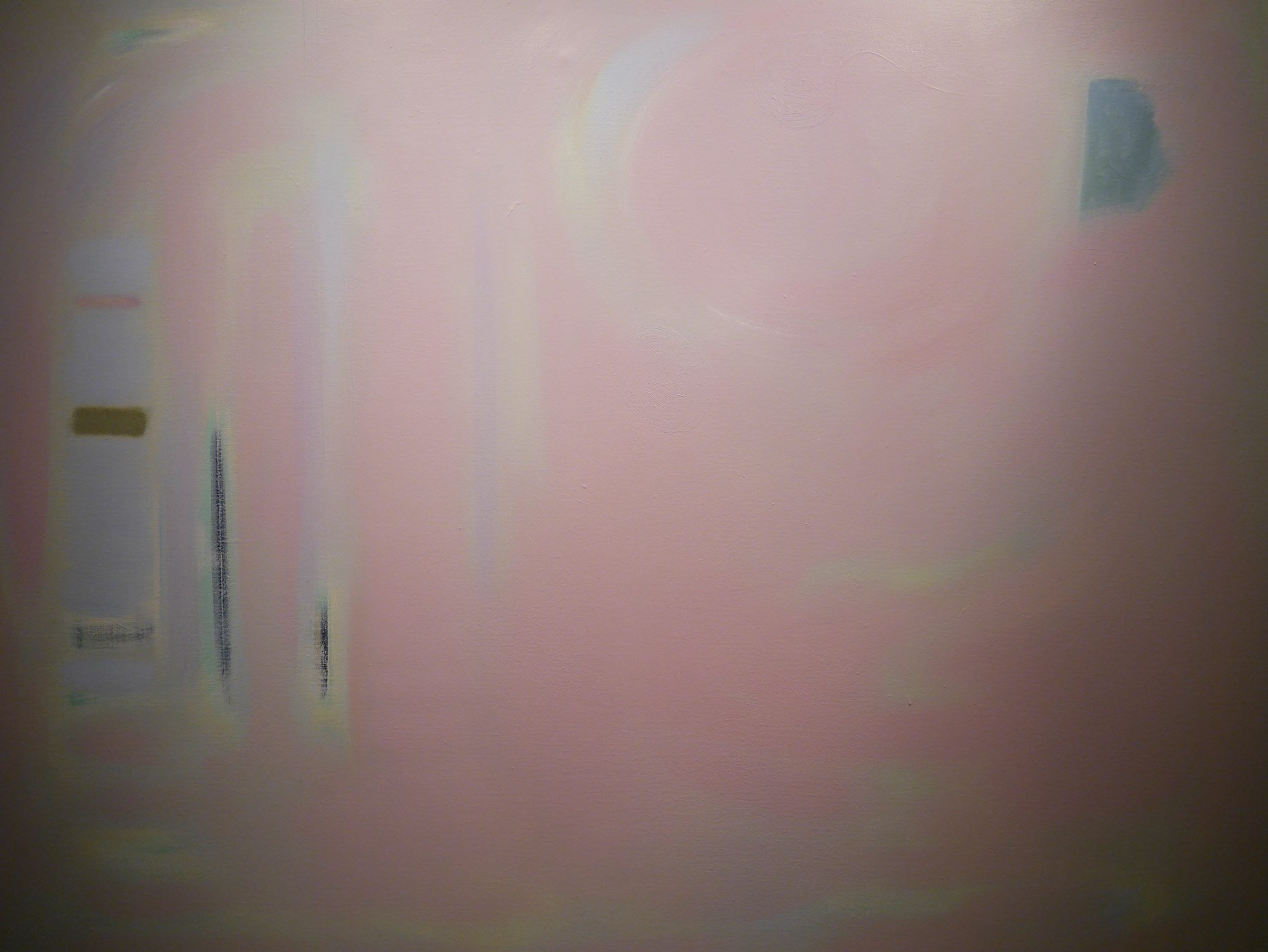
이민정_무제_캔버스에 유채_145×112cm_2012
한 소설가의 말마따나 오해하고, 오해하고, 또 오해하고 주의를 기울여 다시 생각하고 또 오해하는 것이 삶이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이다. 우리가 전시를 보고 느끼는 방법이다. 전시장 바깥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식이기도 하다. 여러 모로 이 계절에 정말 잘 어울리는 전시다. ■목승원